
내가 사는 곳은 푸른 물결이 살아 숨 쉬는 동해바다가 있는 강릉이다. 이 곳에 살면서 좋은 것 중 하나가 어느 시인의 말처럼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를 끝없이 펼쳐진 푸른 망망대해가 지척에 있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끔 시내에 볼일이 있어 나갔다 돌아 올 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바닷길로 돌아온다. 사계절 단 한 번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바다는 늘 설레고 경이롭다.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에는 해변길이 좀 막히지만 그 또한 여름 바다가 주는 즐거움의 하나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그 속에 펄떡이는 물고기마냥 뛰노는 젊음의 낭만에 슬쩍 미소 지을 수 있는 풍경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동해에 하나 둘, 서핑 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만큼 많아졌다.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바다는 파도가 작아 서핑하기에 적당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나는 서핑을 할 줄 모르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큰 파도를 타는 서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즐겁고 재밌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도가 작은 우리 바다에 서퍼들을 보면 괜히 내가 아쉽고 서운하다. 하지만 그런 내 아쉬움과 상관없이 시름없는 젊은이들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만이다. 뜨거운 여름바다의 추억과 기억들이 다시 돌아갈 전쟁 같은 삶에 한 잔의 시원한 아이스커피 같은 힘이 되기만 한다면야 파도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내 찻방에는 ‘억지로라도 쉬어 가라’ 고 쓰인 작은 족자가 하나 걸려있다. 누구를 만나든 항상 삶에는 꼭 휴식이 필요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해마다 여름이면 해수욕을 간다. ‘스님도 해수욕을 하세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어머니의 품 같은 바다가 지척에 있는데 해수욕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라 반문하고 싶다. 올해도 벌써 두어 번 다녀왔다.
나는 유명한 경포해수욕장보다 현지인들만 아는 알려지지 않고 작은, 숨어있는 바닷가를 찾아간다. 그 곳에서도 제일 끄트머리 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수욕을 갔으니 어쨌든 예의상 바닷물에는 한두 번 들어간다. 예전에는 몇 시간이고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 하늘을 보며 물에 떠 있기를 즐겼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물에 들어가기보다 모래사장에 꽂아 놓은 파라솔 그늘 아래, 따뜻한 모래찜질을 즐기게 됐다. 때때로 모래사장에 누워 잔잔한 파도소리를 듣다보면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기도 한다. 꿈결에서 파도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태속에서 들었던 자장가처럼 마음이 둥그러지고 평화로워진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는 파도자국을 따라 맨발로 걷는다. 그러면 발바닥에 느껴지는 젖은 모래와 발목을 적시는 바닷물에 어느새 번뇌가 녹아내린다. 의식하지 않는 사이 가슴은 환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명상이 따로 없다. 더군다나 계절에 상관없이 해질녘의 해변을 걷다보면 적당히 구름이라도 있는 날엔 붉게 물든 석양빛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덤으로 얻을 때도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태풍의 영향으로 육지에서 떠내려 온 온갖 쓰레기에 바닷가는 몸살을 앓았다. 그 때는 내가 좋아하는 모래밭도 걸을 수도 없었다. 다행이 올해는 아직까지 큰비가 오지 않아 깨끗한 바다를 누릴 수 있어 좋지만 뉴스를 보면 기후환경 변화로 세계 곳곳에 태풍과 폭우로 시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 이런 기후와 자연환경의 변화는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무분별한 자연 파괴의 과보인 것이다. 미세먼지로 더 황홀한 노을보다, 점점 좁아지는 백사장이 안타까워 모래를 퍼 나를 생각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기후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구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여 환경 보살로 살기를 바랄뿐이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바다와 추억이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다시 바다를 찾을 것이다. 어머니의 품 같은 평화로운 그 곳 말이다.
현종 강릉 현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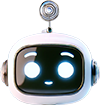 AI기자 요약봇
AI기자 요약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