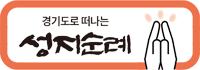
한국 천주교는 처음부터 종교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서양 학문, 즉 ‘서학(西學)’의 일환으로 조선 지식인들의 탐구 대상이 됐다. 1614년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저술한 ‘천주실의(天主實義)’가 소개돼 있다. 이 책에는 신의 존재, 인간의 영혼, 성선설, 만물의 창조 등 서양 철학에 입각한 우주관과 인간론이 담겨 있었으며, 성리학의 한계를 느끼던 조선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사유의 장을 열어주게 됐다. 학문이 신앙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무려 16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천진암에서의 강학과 한국 천주교의 기원
한국 천주교회는 1779년 이벽(李蘗, 1754~1785)이 경기도 광주 퇴촌의 천진암 혹은 여주 산북의 주어사에서 강학(講學)을 시작한 시점을 신앙 공동체의 발상으로 본다. 천주교회는 이벽을 ‘성조(聖祖)’로, 그와 함께 교리를 연구한 정약종,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을 ‘창립선조’로 지칭한다. 이에 대한 역사적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자료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내의 ‘녹암권철신묘지명(鹿菴權哲身墓誌銘)’이다. 이 글에는 "기해년(1779, 정조 3) 겨울, 천진암 주어사에서 강학할 때 눈 오는 밤에 이벽이 찾아와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경전을 토론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를 해석하는 데에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강학 장소가 실제로 천진암이었는지 주어사였는지, 강학의 주제가 성경인지 유교 경전이었는지, 이 만남을 한국 천주교의 최초 집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천진암과 주어사의 장소성
천진암은 본래 불교 암자였으나,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지인들이 자주 찾아와 유학을 토론하던 공간이었다. ‘여유당전서’와 ‘다산시문집’ 등에는 "천진암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유교 경전을 암송했다"거나 "천진암에서 시를 짓고 노닐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곳에서 천주교 관련 서적을 함께 토론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식인들이 불교사찰에 모여 유교, 천주교를 논의했다는 것을 통해 당시 불교의 포용성과 상생을 엿볼 수 있다.
천진암과 주어사는 앵자봉을 중심으로 각각 서쪽과 동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의 행정구역상 천진암은 광주시 퇴촌면, 주어사는 여주시 산북면에 속한다. 두 장소의 거리는 불과 1.5㎞ 남짓이어서, 주어사에 부속된 암자로 천진암을 본다.

◇천진암 성지화 사업에 대한 비판
천진암은 1978년부터 성역화 사업이 본격화됐으며, 변기영 신부의 주도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창립선조 5인의 묘역이 조성됐다. 이후 천진암 대성당 건립이 계획됐으며, 현재는 광암성당, 십자가의 길, 묵주의 길, 세계평화의 성모상, 성모성당 등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천진암 성지화 사업에 대해서는 불교계와 학계 일부에서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가장 큰 쟁점은, 천진암이 원래 불교 암자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천주교 성지로서의 상징성과 신앙적 의미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진암이 천주교의 발상지로 규정하는 근거가 주로 정약용이 지은 ‘권철신 묘지명’의 한 문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해석을 둘러싼 논란 또한 존재해 성역화가 자칫 역사적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성지 조성 과정에서 원래 존재했던 암자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나 자료 보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불교계에서는 천진암이 조선 후기에 운영됐던 의미 있는 사찰이었고, 천주교 박해 때 천주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희생됐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존 종교유산의 맥락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성지화 사업에 대해 불편함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천진암 성지의 현재
천진암 성지 안내소를 지나면 가장 먼저 한국 천주교 창립선조 5인의 대형 모자이크 벽화가 눈에 들어온다. 그 왼편으로 십자가의 길이 반듯하게 이어져 있어, 성지순례는 이 길에서 시작된다. 순례자들은 이 길을 따라 대성당 예정 부지를 지나 천진암 터와 묘역에 이른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약 300m를 오르면 대성당 예정 부지가 나타난다. 약 9만9천여㎡에 달하는 이 부지는 한 바퀴 도는 데 30분이 걸릴 정도로 광활하다. 1979년 조성된 이 부지는 앵자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산자락 중 하나를 절개해 인공적인 분지를 조성한 공간으로, 대지 조성에만 13년이 걸렸다. 이곳에 3만 명을 동시 수용 가능한 대규모 성당을 207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 한다.
예정 부지에서 왼편으로 500m 정도 이동하면 이국적인 조각 양식의 거대한 세계평화의 성모상이 보인다. 그 뒤로는 현대적 디자인의 성모성당이 자리하며, 행사가 있을 때에만 개방된다. 성당 뒤편에는 별도의 고해소가 있으며, 입구에는 역사문화자료 수장고가 조성 중이다.
천진암 성지의 가장 높은 곳에는 창립선조 5인의 묘역이 조성돼 있다. 각각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벽, 권철신, 권일신, 정약종, 이승훈의 묘소를 이장해 한 곳에 모신 것이다. 묘역으로 향하는 길은 ‘강학로’라 불리며, 천진암터를 지나 묘역으로 이어진다. 다만 천진암은 현재 터만 남아있으며, 암자의 규모나 위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1779년 당시 이벽이 강학을 했다는 천진암 또는 주어사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이 많지 않다.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1797년에 지어진 정약용의 시에 천진암이 언급돼 있어,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암자가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묘역에 다다를 즈음, 순례자들은 ‘빙천수’라 불리는 샘터를 만날 수 있다. 이 약수는 예로부터 ‘소미약수’로 불렸으며, 초정약수나 오색약수 못지않은 효험이 있다고 전해진다. 예전에는 천진암에 약수터가 세 곳이나 있었고, 수량도 풍부했다고 한다. 위장병과 피부질환에 효험이 있어 먼 곳에서 물을 길러 오는 이들도 많았다고 하며, 약수로 밥을 지으면 노랗거나 파랗게 물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사유의 열기가 종교사적 전환이 된 곳
천진암 성지는 단지 오래된 신앙의 흔적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다. 한국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출발했던 지적 탐구의 현장이며,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세계관의 전환을 고민하며 유교 전통 안에서 새로운 보편 진리를 모색했던 실험의 공간이었다. 불교 사찰에 모여든 유학자들의 학문적 사유,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작된 종교사적 전환의 한 장면이, 유산의 다층성을 훼손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써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
김지영 헤리티지포올 대표




 AI기자 요약봇
AI기자 요약봇
https://blog.naver.com/macmaca/22389401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