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 경쟁력은 고층빌딩이나 첨단산업단지에 있지 않다. 골목길 김밥집에서 나는 기름 냄새, 철물점 앞에 늘어선 공구들, 세탁소 아주머니의 인사말 속에 숨어 있다. 이곳이야말로 지역경제가 숨 쉬는 현장이다. 그런데 이 골목상권이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전통시장법’과 ‘지역상권법’이라는 두 법률이 상권 지원을 담당한다. 문제는 이 법들이 모두 ‘집적형’ 상권만 상정한다는 점이다. 전통시장법상 골목형상점가는 2천㎡ 내 30개 이상 점포 밀집, 지역상권법상 활성화구역은 상업지역 50% 이상 포함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는 대도시 특정 구역만 혜택을 받는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흩어진 점포들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점포 간 거리가 멀어 ‘연접성’을 충족 못하고, 상업지역 비율이 낮아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생활 밀착형 골목상권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지자체가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상위법 없는 조례는 한계가 명확하다. 재정 규모가 제한적이고,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도 떨어진다. 코로나19 여파와 온라인 상거래 확산,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골목상권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특별법안’은 3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 한다. 방향성은 옳지만, 기존 법령과의 중첩 문제가 우려된다. 동일 상권이 ‘골목형상점가’이자 ‘골목상권 공동체’로 중복 지정될 경우, 주관 부처나 재원 배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골목상권 제도화를 위해서는 점포 수와 면적이라는 경직된 기준을 버려야 한다. ‘골목상권 특성 매트릭스’ 같은 분석틀을 도입해 공간적 연결성, 주민 생활권과의 밀착성, 업종 다양성, 지역 문화·관광 자원 연계성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점포가 흩어져 있어도 동선과 소비 패턴이 연계된 네트워크형 상권이라면 지정 가능하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법·제도와 재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사업을 설계·집행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상인조직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기획·운영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법령상 ‘상권관리기구’나 ‘상권기획자’ 제도를 골목상권 영역에 맞게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성과관리도 중요하다. 단기 사업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매출 변화와 점포 지속률, 고용 창출, 주민 만족도를 종합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효과가 검증된 모델은 확산시키고, 성과 미흡 사업은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골목상권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관계망이 형성되고, 지역 역사와 문화가 재생산되는 ‘생활 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법이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골목상권은 쇠퇴와 함께 공동체적 자산마저 잃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온전히 편입시키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상권 환경에 맞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법·제도 체계다. 그래야만 골목상권이 다시 지역경제의 든든한 뿌리로 기능할 수 있다. 골목의 불빛이 꺼지지 않으려면, 법의 틀부터 새롭게 짜야 한다.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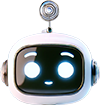 AI기자 요약봇
AI기자 요약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