⑬ '불교미술의 삼합' 파주 보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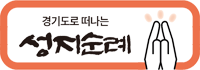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파주는 한반도의 허리에서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며 북한과 접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예로부터 넓은 평야와 완만한 구릉이 펼쳐진 이 지역은 토질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 풍수 명당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조선 왕실은 파주 곳곳에 능과 원을 조성했고, 지금도 묘역과 납골당 등 장사시설이 즐비하다.
고령산 자락 깊은 화장터골에 자리한 보광사(普光寺)는 894년(신라 진성여왕 8년) 창건된 뒤 임진왜란 때 전소됐지만, 1622년 설미 스님과 덕인 스님이 다시 세우며 명맥을 이었다. 사세 확장의 결정적 전환기는 1753년 영조가 보광사를 어머니 숙빈 최씨의 묘소 소령원의 원찰로 삼으면서 찾아왔다. 보광사는 소령원으로부터 불과 3km 떨어져 원찰로서 기능하는데 아주 좋은 입지를 가졌다. 영조는 경내에 어머니의 위패를 봉안한 어실각(御室閣)을 세우고 매년 제를 지내도록 했으며 마당엔 직접 향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진다. 굵직하고 힘 있는 서체로 쓰인 대웅보전 현판도 영조가 직접 썼다 하니 그의 효심이 각별했던 듯하다. 이렇듯 보광사는 왕실, 효심, 불교문화가 겹친 특별한 성역이다.

◇불교미술의 시대상을 간직한 대웅보전 벽화
보광사의 중심 건물, 대웅보전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돼 있다. 대웅보전은 온통 고색창연하게 색칠돼 있다. 여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부와 외부 벽면은 모두 빼곡히 그림으로 채워져 있다.
이 채색들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해서인지 화려함보다 은은한 멋이 돋보인다. 대웅보전은 1897년 상궁 천씨 등의 후원으로 중수됐다고 하는데, 이듬해 순빈 엄씨와 상궁 홍씨가 시주해서 단청을 올렸다고 전한다. 이후 큰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2022년 파주시는 정밀기록화 사업을 통해 단청과 벽화의 정밀촬영, 3D 스캔, 단청 문양 모사 등을 진행했고, 과학적 조사 결과 대부분의 단청과 내부 벽화가 1898년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웅보전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외벽의 판벽화다. 흙벽이나 회벽 위에 그리는 일반 벽화와 달리 이곳 벽화는 나무판에 황토를 발라 표면을 매끈하게 마감한 후 채색을 올렸다. 나무 판벽은 여러 장의 판자를 이어 붙여 만들었는데, 판자 순서를 아라비아 숫자로 써놨다. 이 숫자는 원래 채색으로 가려져야 하지만, 채색층이 떨어지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됐다.

2017년과 2024년에 이송문화유산기술에서 과학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의하면, 청색에는 울트라마린블루와 티타늄화이트, 녹색에는 에메랄드그린이라는 안료가 쓰였다고 한다.
티타늄화이트는 백색을 내는 현대 안료인데, 1960년대 이후 국내에 들어와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에메랄드그린은 구리와 비소가 주성분으로, 19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1970년대 이전까지 많이 사용됐지만 비소의 독성 때문에 이후 사용이 금지되고 크롬그린이란 안료로 대체됐다. 벽화에서 이들 안료가 확인된 사실을 통해 외부 판벽화가 1960~1970년대 초에 제작됐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판벽에 그려진 형상은 사자를 탄 문수동자, 흰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 연화화생도, 반야용선도 등으로, 다채로운 불교적 상징이다. 특히 정토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용선의 모습을 그린 반야용선도는 보통은 배 안에 중생을 가득 태우지만, 이 곳 반야용선도에선 의아하게 중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중생을 태우러 가는 것인지, 채색의 탈락과 함께 중생이 사라져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다.

◇경기도 불화의 보고, 보광사
보광사는 불화의 보고라 할 만큼 다양한 걸작을 품고 있다. 대웅보전에 봉안된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인데, 여덟 명의 보살과 대중이 석가모니를 에워싼 모습이 묘사된다. 화기에 의하면 1898년에 예운상규(禮云尙奎)가 금어(金魚, 우두머리 화승)로, 경선응석(慶船應釋) 및 금화기형(錦華機炯) 등이 편수(片手) 참여해 그렸다. 상규, 응석, 기형 등은 19세기 후반 서울·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불사를 이끈 유명한 화승들이다.
본존불을 중심으로 문수, 보현, 지장, 미륵보살 등이 위계질서에 따라 배치되고, 오색광 대신 금색으로 신광을 채워 본존을 강조한 구도, 강렬한 적색, 녹색, 코발트 청색과 서양식 음영법을 적용한 입체적 표현은 구한말 불화의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불화는 연대가 확실하고 보존상태가 좋을 뿐 아니라 19세기 후반 경기도 지역의 불화 화풍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신중도는 1890년 만일회 때 벽산 용하와 혜산 축연 등 네 화원이 제작했으며, 왕실 상궁의 시주가 기록돼 있어 당시 조정과 사찰의 긴밀한 관계를 알려준다. 화면 구성과 신중상(神衆像)의 배치, 채색 기법은 19세기 말 서울과 경기 불화 양식을 대표한다.

독성도는 1898년 경선 응석을 수화승으로 해 그려진 작품으로, 섬세한 필치와 색감에서 이 지역 불화 특유의 세련됨이 드러나 있다.
신중도와 독성도를 그리는데 사용된 안료는 연백(백색안료), 주사·연단(적색안료), 동록·에메랄드그린(녹색안료), 울트라마린블루(청색안료), 등황(황색안료), 금박, 먹 등 전통과 외래 재료가 고루 사용돼 시대적 전환기의 채색 역사를 증언한다. 또한 화기에는 금어와 화원들의 활동권, 조성 시기, 시주자 등이 명확히 기록돼 있어 조선 후기 불교회화 연구의 핵심 자료가 되고 있다.

대웅보전 옆 관음전(원통전)도 불교예술적 의미가 크다. 1864년에 창건됐으나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뒤 1994년에 재건됐으며, 내부에는 1802년 제작된 지장시왕도가 봉안돼 있다.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시왕과 권속들이 빈틈없이 배치된 이 불화는 18세기 말 경기지역의 전통 화풍을 충실히 보여준다.

◇파주 왕실 능역과 주변 문화유적
보광사를 찾았다면 주변의 왕실 능역과 불교유적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인근의 파주 삼릉(효릉·영릉·순창원)은 태조 이성계의 5대손인 추존왕 덕종의 능과 세조의 아들 예종의 능, 그리고 인수대비의 묘역을 포함해 조선 전기 왕실 장례 문화를 잘 보여준다.
또한 파주 장릉은 인조의 생모인 인헌왕후 구씨의 능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왕실 원·능 제도의 보편성과 역사적 가치를 증명한다. 불교 유적으로는 보광사와 같은 고령산 권역에 자리한 용미리 마애이불입상과, 한강 건너 고양시의 흥국사 등이 가까워 한나절 일정으로 연계 답사가 가능하다.
이들 왕실과 불교 유적은 보광사와 함께 파주가 지닌 깊은 종교문화의 뿌리를 한층 더 입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김지영 헤리티지포올 대표




 AI기자 요약봇
AI기자 요약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