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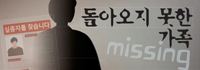
경기도에서 해마다 약 1만3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수백 건은 여전히 장기 미해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종자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한다.
홍성삼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 사건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당시의 흔적이 사라져 해결이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사건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AI)으로 실종 아동의 성장 후 모습을 예측하거나, 실종자의 현재 모습을 추정하는 방식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며 “SNS를 통한 전국적 정보 공유도 효과적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 실종 현장의 변화를 먼저 언급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전지문등록제 도입이다. 이를 통해 아동 실종 대부분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종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종은 가족이 생존하는 한 끝나지 않는 문제”라면서 “사회 전체가 실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했다.
해외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을 검토해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경찰이 협력하는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며 “민간은 예방과 교육, 지역사회 연계 역할을 맡고, 경찰은 수사와 구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분담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찰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어 민간 참여가 제한적이다. 지역 단위의 가족 자치 센터나 민관 협력 기구를 구성해 실종 대응의 체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여 년간 딸을 찾고 있는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 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가족을 찾거나 생이 마감돼야 끝난다”며 “정부가 전문 방송 채널을 운영해 실종자 정보를 상시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도, 일상에서도, 심지어 투병 중에도 실종자를 찾는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남들의 평범한 매일이 우리에겐 소망이자 꿈”이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실종은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는 점이다.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기록 관리 체계 확립, 민관 협력 모델 도입, 첨단 기술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동시에 작동해야 장기 미해제 실종 사건을 줄일 수 있다.
이석중 기자
관련기사
- [돌아오지 못한 가족] "가슴에 묻을 수도 없어"… 실종 가족의 삶은 멈췄다 경기도에는 아직도 225건의 실종 사건이 미해제로 남아 있다. 숫자로만 기록된 통계 뒤에는 세월이 흘러도 멈추지 않는 기다림과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 존재한다.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A씨 역시 그 차가운 숫자 속에 묻힌 한 사람이다.A씨의 아들 장성길 군은 실종 당시 9세였다.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유치원에 다녔지만, 1999년 1월 27일 등원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유치원 관계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행방을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본 적 없다”는 말뿐이었다.“지금 같으면 난리 났겠지만, 그땐 그냥 그렇
- [돌아오지 못한 가족] 매년 1만3천건 속 장기 실종 225건… "사회 전체의 과제" 경기도에서 해마다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1만3천여 건 안팎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수일 내 발견되지만, 수백 건은 여전히 장기 미해제 상태로 남아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정부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실종 신고 건수는 4만9천624건에 달했다. 4만8천872건이 새롭게 발생한 건이었고, 경찰은 이 중 4만8천751건을 해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121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다.2022년부터 지난




 AI기자 요약봇
AI기자 요약봇